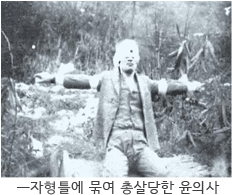매헌 윤봉길 의사는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1908 ~ 1932) 의사는 1908년 덕산면 시량리 목바리 마을에서 아버지 윤황과 어머니 김원상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8년 덕산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다음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아 식민지 노예교육을 거부하고 학교를 자퇴하였다. 1921년 지금의 덕산 둔리저수지 근처에 있었던 성주록 선생이 운영하던 서당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유학을 공부하였는데, 단지 유학만 공부하지 않고 당시에 출판되던 잡지와 책들을 보면서 신식 학문과 세계정세를 익혔으며, 적을 알기 위해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여 익혔다. 15세에 부친이 동학군 출신이었던 배용순과 결혼하였으며, 1926년부터 유학 공부를 마치고 농민 계몽 운동에 뛰어들었다.
윤의사는 1927년 야학(夜學 - 밤에 공부하는 학교)을 열고 직접 손으로 쓴 <농민독본(農民讀本)>이라는 교과서로 배우지 못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쳤다. 1929년 부흥원(復興院)을 설립하여 농민 계몽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는데, 학예회를 열어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토끼와 여우〉라는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의사는 지역의 농민들을 모아서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과 민족의식을 길렀다. 또, 수암체육회를 만들어 같이 모여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감시와 탄압이 점점 강해지자 의사가 주도하던 농민 계몽 운동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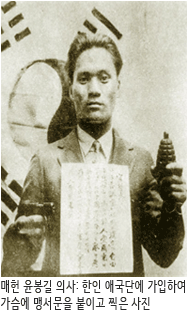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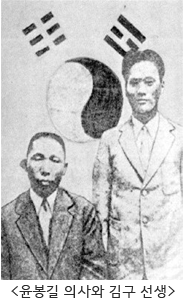
결국 윤의사는 1930년 3월에 “장부가 집을 나감에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丈夫出家 不生還)”는 글을 남기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더 큰 독립 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윤의사는 만주를 거쳐 다롄과 칭다오로 건너가 1931년 여름까지 현지 사정을 경험하면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생각하였다. 8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간 윤의사는 상하이 프랑스 조계(租界 - 다른 나라의 땅 일부분을 강제로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지배하는 지역)에 있던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의 집에 묵었는데, 동포 사업가 박진이 경영하던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다가, 그 해 겨울에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일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주도하던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칠 각오임을 말하였다.
1932년 1월 한인 애국단 단원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고, 일제는 상하이 중국인들의 반일 시위를 빌미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상하이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였다. 야채상으로 가장해서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하던 윤의사는 드디어 4월 26일 한인 애국단에 입단하여 “나는 적성(赤誠 - 순수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屠戮 - 죽임)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는 선서식을 하였다. 그리고 백범과 협의하여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군의 이른바 ‘천장절(天長節 - 일본 왕 생일 축하일) 겸 전승 축하 기념식’에 폭탄을 던지기로 하였다.
폭탄 준비는 백범이 맡았고, 윤 의사는 여러 번 홍커우 공원을 답사하였다. 백범은 중국군 장교로 있던 김홍일에게 부탁해 도시락과 물통을 가장한 폭탄을 준비했다. 거사를 결심한 후 윤의사는 숙소의 물건을 정리하고, 고향의 아들과 조국의 청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썼다. 4월 29일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난 윤의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백범과 아침식사를 하였다. 김구의 <백범일지>에 따르면 윤의사는 백범에게 자신의 회중시계를 주면서 “6원을 주고 새로 산 것입니다.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이니 나에게 주십시오. 제 시계는 한 시간밖에 소용이 없습니다”고 말하였다. 택시를 타고 7시 30분경 홍커우 공원에 도착한 윤의사는 입장을 막는 경비원에게 능숙한 일본어로 “나는 일본인이다. 입장권이 무슨 필요있나”라고 말하며 들어갔다고 한다.

폭탄을 던지기 좋은 위치로 다가가 기다리던 윤의사는 천장절 의식 행사가 시작되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물통형 폭탄을 단상 위로 힘껏 던졌다. 폭탄이 크게 폭발하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쓰구 등이 죽고, 총영사 무라이,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 주 중국 공사 시게미쓰 마모루 등이 중상(重傷)을 입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중국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蔣介石)는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며 감탄하였고, 분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현장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된 윤의사는 5월 25일 상하이 일본군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1월에 일본 오사카 위수형무소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가나자와 육군형무소로 이송되어 11월 19일 새벽 6시 경에 총살당하였다. 윤의사의 나이 25세였다. 일제는 윤의사의 유해를 형무소 근처에 암매장(暗埋葬 - 무덤을 만들지 않고 몰래 매장함)했으나, 해방 후 김구, 신현상 선생 등의 노력으로 묻힌 곳을 찾아서 유해를 발굴하여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우리나라로 모셔와서 서울 효창공원 묘지에 안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