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선생은
김정희(1786-1856)는 1786년 6월 3일 현재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영조 임금의 사위 김한신의 손자인 이조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태어나, 큰아버지인 김노영의 양아들로 입양(入養)되었다.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노과(老果) 등 여러 가지를 썼다. 조선 후기에 금석학(金石學 - 오래된 금속이나 돌에 새겨진 글씨를 연구하는 학문)에 큰 업적을 쌓은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서화가(書畵家 - 서예와 그림 예술가)였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섰던 추사는 북학파(北學派 -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학파)의 주요 인물이었던 박제가의 눈에 들어 그로부터 실사구시(實事求是 - 실제적인 것과 진실된 것을 추구함)의 학문을 전수받았다. 24세 때는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청나라의 서울 연경에 사신 일행으로 가서 당시 중국 최고의 고증학(考證學 - 유경 경전을 사실적 근거로써 꼼꼼히 따지고 분석하여 연구하는 학문)자였던 완원(阮元, 1764 ~ 1849), 옹방강(翁方綱, 1733 ~ 1818)과 교류하여, 이들로부터 고증학을 배워서 금석문(金石文)의 글자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법과 옛 글씨체를 쓰는 법을 익혔다. 그 후 일생 동안 청의 고증학자들과 편지를 통해 교류하였다. 31세(1816년)에 ‘실사구시설’을 저술하고,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考證 - 연구하여 증명)하였다.

34세(181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참의, 충청도 암행어사, 병조참판 등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1840년 7월에 다시 청나라에 사신으로 예정되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윤상도 옥사(獄死) 사건에 관련되어 제주도에 9년간의 유배의 길을 떠났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을 품었으나, 곧 마음을 다스려서 학문과 예술을 더욱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다. 제주도에서 그는 금석학을 계속 연구하고 서예를 더욱 열심히 연마(硏磨 - 갈고 닦음)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독특한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함으로써 우리나라 학문과 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가 만든 독특한 추사체는 추사의 학문적인 깊이와, 오랜 유배 생활을 이겨내고 예술의 경지(境地 - 최고 수준)에 이른 그의 인내(忍耐)와 인품(人品)을 집중하여 모은 발명품이었다.
추사는 그림에서도 문인화(文人畵 - 시나 문장이 같이 있는 그림)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는 난(蘭)과 산수(山水)를 잘 그렸는데, 그의 그림에는 독특한 개성(個性)과 천재성, 높은 학문 수준과 예술성이 드러난다. 그는 인격도야(陶冶 - 도자기를 굽듯이 마음을 단련시킴)를 바탕으로 철저히 학문을 연구하고 충분히 정통 서법(書法)을 연마해야만 맑고 수준 높은 선비의 정신세계를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이 ‘불이선란(不二禪蘭)’과 국보 180호 ‘세한도(歲寒圖)’이다.
불이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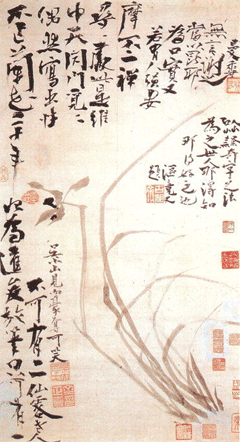
두 번 그리기 힘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난(蘭)이라는 뜻
세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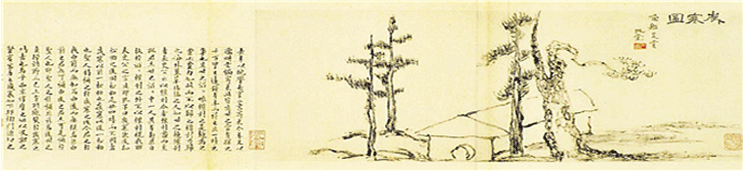
제주도 유배 시절에 ‘세한송백(歲寒松柏) ―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즉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 선비의 지조(志操)와 기개(氣槪)가 더욱 빛난다’는 옛 글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그린 그림
추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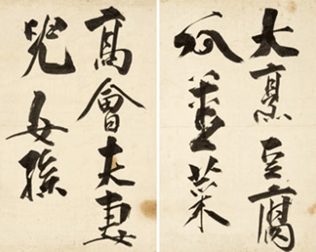
매우 자유스러운 움직임 속에 교묘한 질서가 있어서 높고 맑고 아름다운 선비의 멋과 인품이 흘러넘치는 예술적인 글씨체이다.
추사 고택은
추사고택은 추사의 증조부이며, 영조 임금의 사위 월성위 김한신이 1700년대 중반에 지은 53칸 규모의 양반 집으로 추사 선생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인들과 신분이 낮은 손님이 머물렀던 행랑채가 모두 없어져서 가장 중심되는 건물만 남아 있다. 고택 주변에는 추사묘, 김한신․화순옹주의 묘와 정려문(旌閭門 - 뛰어난 효행이나 부인의 절개를 칭찬하기 위해 임금이 내린 상장 액자가 걸려 있는 문), 백송(白松 - 추사 선생이 청나라에서 가져온 껍질이 하얀 소나무), 추사 선생 가문(家門)의 절인 화암사 등이 있다.
고택은 솟을대문, 안채, 사랑채, 사당(祠堂 - 조상께 제사지내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 솟을대문을 들어선 마당에 자리 잡은 사랑채는 ‘ㄱ’자 형 집이다. 사랑채는 온돌방과 대청마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마루가 긴 이유는 집안의 남자 어른이 손님을 맞거나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과 예술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랑채 뒤에 있는 안채는 6칸의 대청과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 및 건넌방의 부엌과 안대문, 좁은 문, 광 등을 갖춘 ‘ㅁ'자형 집이다. 이러한 ‘ㅁ'자형 가옥은 중부 지방과 영남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대갓집’형이다.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었으며, 남성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사랑채와 안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 가옥이 ‘남녀유별’이라는 유교 사상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